30대 여기자의 일상다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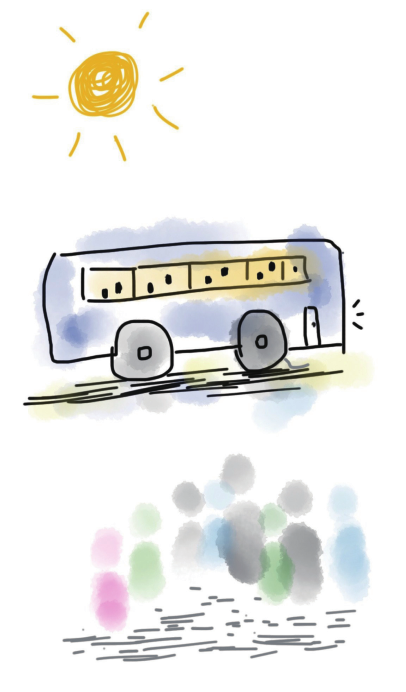
꽤나 오래도록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 ‘워라밸’이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체감한다. 10년 전 첫 사회생활과 비교해보면, 출퇴근 눈치보기와 부어라 마셔라 했던 회식도 말끔히 사라졌다. 기업과 조직문화 그리고 사람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분명 워라밸은 우리 곁에 적절히 자리잡았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출퇴근 시간 범위가 넓어지면 지하철, 버스로 미친 듯이 몰리는 사람들이 분산되어 그나마 편히 발 딛고 출근하겠다 기대했는데 이제는 아침 7시부터 거진 10시가 되어가서도 대중교통에 사람이 줄지 않는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밀집한 주요 지하철역은 오후 4시 반쯤부터 붐비기 시작해 6시 이전에 이미 지옥철이 된다. 물론 관광객도 적지 않다지만, 대부분은 직장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고 칼퇴를 하건만, 최소 왕복 2시간이라는 서울 근로자들의 출퇴근길은 여전히 곤혹스럽다. 오죽하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아침저녁 지하철 타는 일이 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까.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편도 약 2시간, 왕복 4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는 지인은 6시 칼퇴를 해도 넘치는 사람에 치여 만차를 보내기가 기본 두세 차례라고 한다. 겨우 타고 가도 집에 도착하면 빨라야 8시. 유치원생 자녀는 이미 엄마와 저녁을 먹은 뒤라 결국 평일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홀로 식사를 해야 한다. 퇴근을 한 시간 당기려면 출근을 그만큼 일찍 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고, 재택근무는 회사에서 용인하지 않는 상황,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가는 일은…… 모두가 알다시피 불가능한 일이다.
‘본인이 선택한 직장이고 집 아닌가, 몇 시간이 걸리든 칼퇴하고 가면 된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끊임없이 외치는 ‘워라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치가 여기에 숨어있다.
널뛰는 집값에 외곽 출퇴근을 선택한 사람이든,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든 지옥 같은 대중교통이 워라밸의 시작과 끝을 움켜잡고 괴롭힘을 잘 알고 있다. 상쾌한 아침, 기분 좋은 저녁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잔뜩 날이 선 사람들 간의 다툼과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특히 서울 중심부를 순환하는 2호선과 동서를 관통하는 9호선은 악명 높다. 이용객 수요예측에 실패(?)한 9호선은 짧은 플랫폼과 적은 객량으로 지옥철의 역사를 새로 썼다. 서울 시내버스와 경기도 광역버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미 꽉 찬 버스인 줄 알면서도 타야만 하는 사람들, 시간에 쫓기는 버스기사의 짜증도 익숙하다. 세계 전례 없이 많은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자랑하는 편리한 서울이건만, 1천만 인구와 그 외 유동 인구의 편안함까지 책임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생각을 정리하면,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워라밸이 이뤄지려면 기업에게만 뭐 해라, 뭐 해라 명령하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나마 아낀 체력과 시간을 길에서 엄하게 허비하지 않도록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일부터 되짚었으면 한다. 잡히지도 않는 집값보다 소소한 시민,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아이디어를 찾는 편이 낫지 않을까.
“엄마, 지하철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힘들어.”
“아빠처럼 일 끝나서 퇴근하는 사람들이야. 조금만 참아, 아빠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온갖 짜증, 화, 한숨이 뒤섞인 아침저녁 풍경 속, 워라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