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기자의 일상다반사
Episod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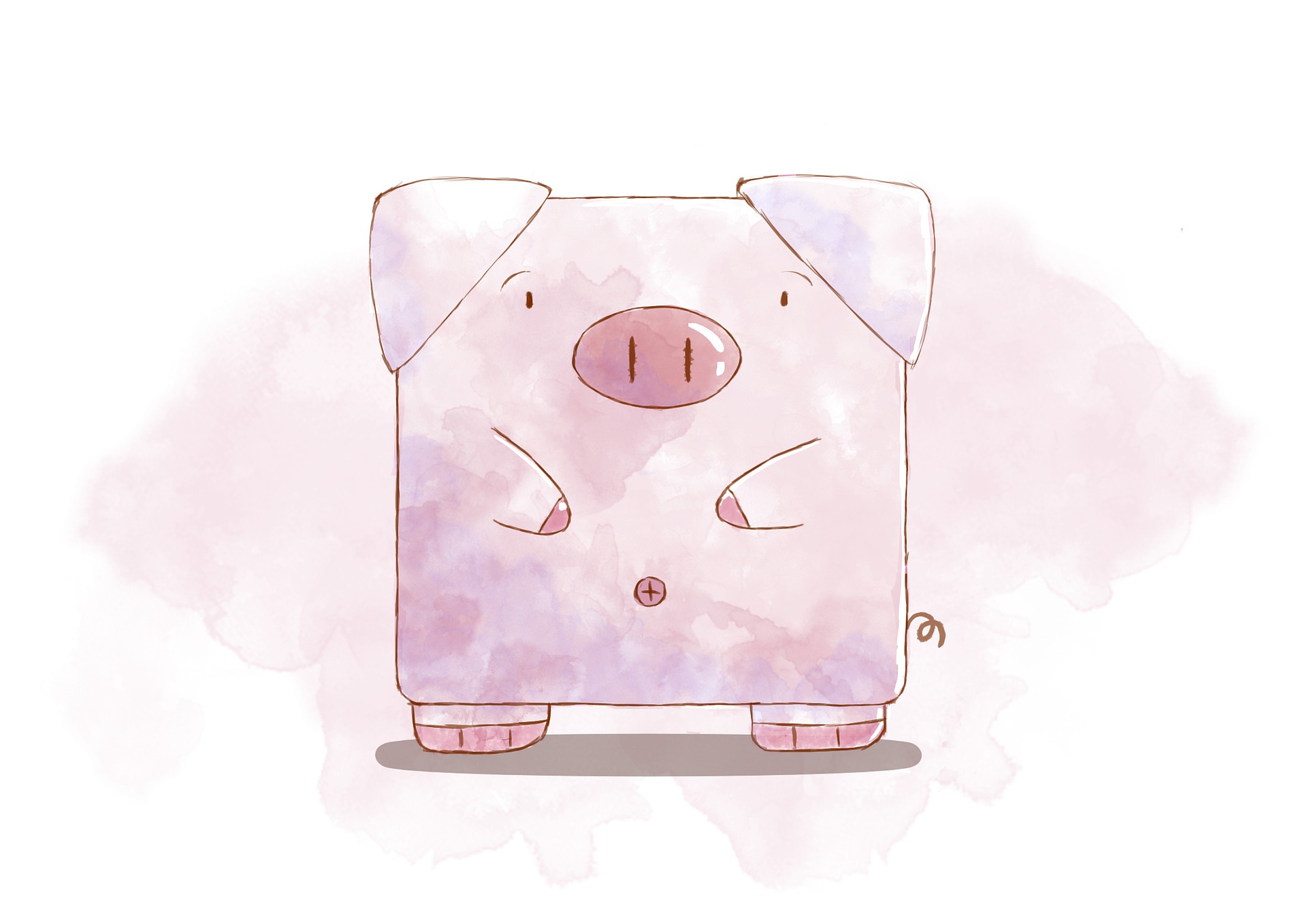
어릴 때는 ‘꿈은 당연히 매일같이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늘을 나는 꿈, 떨어지는 꿈, 쫓기는 꿈, 허겁지겁 먹는 꿈, 대성통곡하는 꿈 등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며 나름대로 재미난 몽중 세계를 즐겼 다. 꿈에서는 늘 내가 주인공이고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흥미진진하니, 다음날은 어떤 꿈을 꿀까 살짝 기대도 했었다. 그런데 중학생 때인가, “꿈을 기억한다는 건 뇌가 깊은 잠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야, 꿈을 안 꾸는 게 성장에도 좋고 다음날 몸도 가벼워”라는 어느 선생님의 말을 들은 뒤부터 꿈자리가 너무 불편해졌다. 그녀의 말처럼 꿈을 꾸고 난 아침은 잠도 잘 안 깨고 어깨도 무겁고 속도 더부룩했다. ‘꿈은 몸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어떻게든 꿈을 안 꾸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쫓기고 떨어지고 숨고 기어오르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내는 꿈속 시간은 차츰 버거워졌다. 종교는 없지만 이런저런 신들을 들먹이며 기도도 해보고 쏟아지는 잠을 참는 등 꿈과 멀어지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늘 똑같았다. 엄마에게 “꿈을 꿔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더니 “키 크느라 그래”라는 단답이 전부였다(실제로 중3 때 8cm가 크긴 했지만).
어쨌거나 꿈은 일상이 되었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 항상 피곤하다, 의욕이 없다’는 핑계를 꿈 탓으로 돌리며 지내던 중, 생각의 변화는 고3 때 다시 일어났다. 처음으로 연예인 꿈을 꾼 것이다.
“배용준이 황금열쇠를 주며 프러포즈를 했다고? 야, 복권 사봐.”
“아니야, 남자친구 생기는 꿈 아냐?”
“배용준을 좋아해서 그냥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분 좋으면 됐지 뭐.”
친구들은 이런저런 해몽을 늘어놓았다. 딱히 배용준을 좋아한 건 아니었고 당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로 히트를 칠 때라 ‘별 뜻 없이 나왔나 보다’ 싶었지만, 설레는 마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생전 처음으로 복권을 샀다. 당첨이 됐을까?
한 장에 천 원짜리 복권 세 장을 차례로 긁었다. 당첨금은 천 원.
투자 대비 손해였지만 ‘당첨’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꿈 뭐지?”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더 대박인 건, 그로부터 몇 일 뒤 학원에서 어떤 남학생으로부터 고백도 받았다는 것!(사귀진 않았지만, 두고두고 떠올리는 행복한 장면이 되었다.)
그 뒤로 나쁜 꿈보다 좋은 꿈에 집중했다.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는 말 대신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길몽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돼지, 똥, 대통령 등을 계속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기를 여러 날. 드디어 응답이 왔다.
집 현관 앞에 새끼돼지들이 몰려있는 것 아닌가!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오려는 돼지들, 당연히 두 손 벌려 맞이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 꿈속의 나는 돼지들이 징그러워 쫓아내기 바빴다. 결국 한 마리도 들이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꿈에서 깼을 때 처음으로 ‘허탈함’의 진정한 뜻을 깨달았다. 마치 택시에 로또 1등 당첨 종이를 두고 내린 것처럼, 확실한 행운을 내 손으로 던져버린 기분이 들었다. 혹시나 싶어 복권을 샀지만 역시나 꽝이었다. 이후 다시 몇 차례, 행운이 아닐까 싶은 꿈을 꿨지만 놀랄 만한 일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돼지를 집안으로 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목적과 목표 없이 인생을 표류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 아닐까.
꿈 꾸기를 놀이기구 타듯 즐겼던 어린 시절을 지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악몽으로 돌변, 다시 요행을 바라는 덧없는 기도로 이어진 꿈에 대한 환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아무 뜻 없이 찾아오는 꿈들을 어떻게든 의미부여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욕심이 스스로도 ‘참 볼품없다’ 싶지만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돈 안 드는 일인데 어때!
